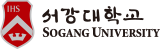한스 발덴펠스
생애
독일 예수회 신부이면서 기초신학자인 발덴펠스는 1931년 10월 20일 독일 에센에서 태어났다.
그는 독일 현상학자인 베른하르트 발덴펠스의 형이다.
발덴펠스는 1951년 예수회에 입회하였으며,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뮌헨 풀라크에 있는 Philosophische Hochschule Berchmanskolleg에서 철학을 공부하였다.
이후 1960년에서 1964년까지 도쿄에 있는 카톨릭 소피아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1963년에는 도쿄에서 타츠오 도이(Tatsuo Doi)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다.
또한 발덴펠스는 교토 제국 대학에서 방문학생으로 있으면서 타케우치 오시노리와 니시타니 케이지를 통해 교토 학파의 철학을 접하게 된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발덴펠스는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과 뮌스터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1969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한다. 칼 라너에 영향을 받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계시. 새로운 신학의 배경에서 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그리고 그 이후 1976년에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한다.
1977년 발덴펠스는 본(Bonn) 대학에서 기초신학, 종교신학 그리고 종교철학 담당 교수로 임용된다.
여기서 그는 1979년부터 1980년까지 그리고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카톨릭 신학부의 학장을 역임하고, 1997년에 은퇴한다.
2010년 5월 25일 발덴펠스를 중심으로 한 문맥적 기초신학을 장려하기 위한 Waldenfels-Born 재단이 설립된다.
주요 업적과 사상
발덴펠스의 기초신학에서 ‘문맥성’(Kontexualität)은 핵심 개념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더 이상 유일한 표준이 될 수 없는 그리스도교적 근대 사회에서는 미래에 열린 신학이 신학내부적인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학이 비그리스도교적 맥락에서, 즉 무신론자와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 의해서도 이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을 맥락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덴펠스는 한편에서 그리스도교의 고유성에 천착한 기초신학적 기본 전제에 충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본 전제를 비그리스도교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덴펠스는 항상 비신학 분야, 특히 종교학과 긴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여러 문화를 관통하는 종교적이고 종교사적인 연구에 집중한다.
더욱이 그는 신학, 종교학 그리고 종교철학의 학제적 경계영역에서 한계를 초월하는 문맥적이고 대화적인 고찰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덴펠스는 그리스도교와 불교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며, 그의 시도는 그의 주저 중의 하나인 『절대 무』(Absolutes Nichts)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저서에서 발덴펠스는 불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세계 교회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문맥적 기초신학’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는 『절대 무』에서 동양과 서양의 대화를 시도하는 교토 학파의 중심사상을 고찰한다.
발덴펠스는 특히 교토학파의 니시타니가 동서간의 대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니시타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결합된 서양에서 만연하는 목적론적인 세계 해석이 근대 이후의 세계관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이를 넘어서 있는 불교적인 종교성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한다.
니시타니는 특히 자연을 지배하려는 근대적 인간상을 비판하면서 망각된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나-너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시도한다.
발덴펠스는 불교적 통찰이 그리스도교로 하여금 참된 자기에로의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발덴펠스는 그의 문맥적이고 대화적인 고찰방식으로 수행한 내재적인 교회비판과 종교 외적으로 그리고 종교 상호간의 관점에서 수행된 종교비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리스도교 신앙에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주요 저작
Waldenfels DB
| 총 게시물수: 672 | 페이지:1/34 |
|
번호 HW01300672 HW01300671 HW01300670 HW01300669 HW01300668 HW01300667 HW01300666 HW01300665 HW01300664 HW01300663 HW01300662 HW01300661 HW01300660 HW01300659 HW01300658 HW01300657 HW01300656 HW01300655 HW01300654 HW01300653 제목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불교의 공과 하나님 주제 사랑의 빛을 비추는 깨달음과 깨달음을 동반하는 감동적인 사랑은 서로 서로의 조건이 된다.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한 깨달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그를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자비를 베푸는 데에 참여하라고 부른다. 비약은 모든 비약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그 결과 결국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간 존재를 수용하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무자기성과 자기 외화, 그리스도의 무자기성과 자기 외화의 실존적 실행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만 불교도와 대화할 수 있다. 사랑은 무(Nicht)와 공(Leere)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랑은 무(Nicht)와 공(Leere)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랑은 무(Nicht)와 공(Leere)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랑은 무(Nicht)와 공(Leere)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랑은 무(Nicht)와 공(Leere)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랑은 무(Nicht)와 공(Leere)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랑은 무(Nicht)와 공(Leere)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신의 자기 공화의 동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된 화해는 기독교가 현대 과학의 합리적 객관성을 포괄할 때에만 달성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식은 ‘무신성’(Gott-losigkeit)에 대한 이중의 해석을 연상시킨다. 기독교인도 불교도도 모두 그들의 희망의 근거를 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공의 이중성은 신 없는 현실로서의 ‘공’과 신의 인감되심을 통한 신으로 충만된 현실로서의 ‘공’을 가리킨다. 신이 근원적인 자기 자신에 있어서 어떤 생성의 필요성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근원에서 생성되는 타자를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어떤 생성된 것이 되는 것이 신 자신의 자기 비움(또는 자기 외화, Selbstentäusserung)이고 생성이며 신 자신의 kenōsis와 genesis이다. 신이 근원적인 자기 자신에 있어서 어떤 생성의 필요성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근원에서 생성되는 타자를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어떤 생성된 것이 되는 것이 신 자신의 자기 비움(또는 자기 외화, Selbstentäusserung)이고 생성이며 신 자신의 kenōsis와 genesis이다. 저자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한스 발덴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