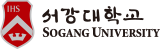임마누엘 칸트
생애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 4월 22일 당시 프로이센 공국의 수도이자 중요한 무역항 중의 하나인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한 소규모 수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곳에서 어린 칸트는 일찍부터 넓은 세계와 접촉하게 되었다. 부친 요한 게오르그 칸트는 아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수공인의 정신과 자의식 있는 시민 정신을 심어 주었고, 뉴른베르크 태생의 모친 안나 레기나는 선명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신심이 깊은 모친은 온건한 경건주의 신앙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칸트는 1732년에 콜레기움 프리데리키아눔에 입학하여 1740년까지 다녔고, 이어서 대학에 진학하였다. 1746년 대학공부를 마친 후에 수년간 칸트는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를 하였고, 1755년 대학에 돌아와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1766년 쾨니히스베르크 왕립 도서관의 부사서로 일하게 됨으로써 그는 처음으로 고정 급여를 받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1770년에 칸트는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담당하는 정교수직을 얻게 되었다. 칸트는 1786년과 1788년 두 차례 총장을 역임하였다. 칸트는 1794년 이후 차츰 강의 활동에서 물러났고 1804년에 죽음을 맞이하여 대학 교회의 교수묘지에 안장되었다.
주요 업적과 사상
칸트는 철학의 근본문제로 다음의 세 가지, 즉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 세 가지 물음은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종교철학의 근본 물음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 세 가지 근본물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이 근본 물음을 탐구하기 위하여 칸트는 자신의 비판철학을 확립한다. 칸트에서 ‘비판’(Kritik)이란 영역 가르기이다. 칸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계와 경험할 수 없는 예지계라는 두 영역을 구분하고, 자연과학의 영역은 현상계에 그리고 도덕과 종교의 영역은 예지계에 위치시킨다. 그는 신앙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식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이 두 영역의 근본 문제를 칸트는 그의 주요 저작인 세 비판서, 즉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다룬다. 특히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를 통하여 초월적(transzendental) 방법론을 확립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대상 자체가 아닌 대상의 가능조건을 탐구함을 의미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 가능조건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식능력으로서의 이성이며, 이 이성은 경험과 함께 출발하지만 경험에 선행하는 선험성(Apriorität)을 지닌다. 칸트는 이를 ‘초월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탐구되어야 할 중심문제는 어떻게 경험에 선행하는 선험적(a priori) 이성 인식이 경험적, 즉 종합적일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또한 칸트는 실천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도덕철학을 새롭게 근거짓는다. 인식과 관련하여 이성이 감관을 넘어서는 것이 이성의 이론적 사용이라면, 행위와 관련하여 이성이 감관을 넘어서는 것이 이성의 실천적 사용이다. 칸트에서 실천이성은 감성적 규정근거들, 충동, 욕구와 열정 그리고 쾌와 불쾌의 감각과 독립하여 행위를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칸트는 도덕철학을 근거지움에 있어서 네 가지 기본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칸트는 도덕성 개념을 자신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둘째, 정언명법을 따라야 하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가 처한 상황에 이 도덕성 개념을 적용한다. 셋째, 도덕성의 원천을 의지의 자율성에서 찾는다. 넷째, ‘이성의 사실’ 개념을 통하여 도덕성의 현실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칸트는 도덕철학과의 연속성 속에서 종교철학을 전개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단순히 교의적인 신앙과 도덕적 신앙을 대립시킨다. 칸트는 모든 사변적인 신존재 증명을 비판하고, 도덕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신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모색한다. 이러한 도덕신학 또는 윤리신학은 특별한 종류의 믿음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신은 더 이상 지식의 대상, 객관적인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희망의 대상이다.
주요 저작
Kant DB
| 총 게시물수: 1660 | 페이지:1/83 |
|
번호 IK00101660 IK00101659 IK00101658 IK00101657 IK00101656 IK00101655 IK00101654 IK00101653 IK00101652 IK00101651 IK00101650 IK00101649 IK00101648 IK00101647 IK00101646 IK00101645 IK00101644 IK00101643 IK00101642 IK00101641 제목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주제 이성적 피조물은 도덕법칙을 통해 인격의 도덕적 가치에 부합해 있는 최고선에 참여할 품격을 갖는다. 순수한 실천적 이성신앙은 자신을 지시명령이라고 고지한다. 이성의 지시명령은 경향성에 기초해 있을 수 없다.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인 마음씨는 최고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천이성의 요구는 의무에 기초해 있다. 도덕법칙은 순수 실천이성의 대상인 최고선 개념을 통해 최고 존재자로서의 근원 존재자 개념을 규정한다. 실천이성의 도덕원칙은 최고로 완전한 세계 창시자를 전제하고서만 허용된다. 실천법칙은 지성과 의지의 관계를 선험적으로 규정한다. 신, 예지 세계 그리고 영혼의 불사성은 순수하게 실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성의 이념들 일반의 실재성은 순수 실천이성을 통해 마련된다. 자유, 영혼의 불사성 그리고 신은 실천법칙에 의해 객관적 실재성을 얻는다. 도덕법칙을 근거로 순수 실천이성은 우리의 인식을 확장한다. 실천이성은 도덕적 입법을 통해 근원적 존재자라는 신학적 개념에 의미를 부여한다. 실천이성은 자유의 실재성과 예지세계의 법칙을 명시한다. 요청들은 사변 이성의 이념들에게 객관적 실재성을 준다. 요청들은 모두 도덕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도덕성만이 이성적 존재자의 행복에 대한 희망을 위한 척도를 함유한다. 행복에 대한 희망은 오로지 종교와 더불어서만 개시된다. 종교에 도덕이 더해지는 때에만 행복에 대한 희망도 나타난다. 최고선의 촉진을 지시하게 되는 의지의 규정근거는 도덕법칙이다. 저자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