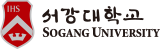마르틴 하이데거
생애
하이데거는 1889년 독일 슈바르츠발트 지방의 메르키르히에서 소박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9년에 예수회에 가입했으나 1911년 예수회에서 탈퇴한 후 철학공부를 하기로 결심한다.
1913년에는 『심리주의에서의 판단론』으로 신칸트학파의 거장인 하인리히 리케르트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1916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후설이 부임하게 되고 1919년부터 5년간 하이데거는 후설의 조교일을 맡으면서 현상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다.
1916년에 교수자격논문을 마친 하이데거는 1917에 개신교 신자인 엘프리데 페트리를 만나 결혼한다.
그리고 2년 후에 가톨릭 교회로부터 멀어진 하이데거는 개신교 신학에 빠져든다.
1918년부터 하이데거는 루터 전집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개신교 신학저서들을 탐독하기 시작한다.
1927년에는 서양 현대철학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그의 주저 『존재와 시간』이 출간되며, 1928년 후설의 후임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 정교수로 부임한다.
그 후 1933년 1월에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고 하이데거는 5월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에 취임하고 나치당원에 가입한다.
1934년 3월에 그는 총장직을 사퇴한다.
1945년 독일이 전쟁에서 항복하게 되는데 1945년부터 1951년까지 하이데거는 나치에 가담한 이유 때문에 강제 휴직되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한다.
1951년 그는 복직되어 다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퇴임하고 저술활동에 몰두한다.
976년 하이데거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은 그의 고향인 메스키르히에서 그의 요구에 따라 가톨릭 방식으로 치러졌다.
주요 업적과 사상
1927년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출간되었는데. 발터 슐츠는 『존재와 시간』을 이렇게 평가한다.
“20세기 유럽 철학 사유는 이제부터 『존재와 시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추구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전통 존재론적 사유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명하는 것이며, 이 해명을 통해 하이데거는 20세기 서양 현대철학에 새로운 사유의 길을 열어 밝힌다.
그리고 이 해명은 하나의 조건, 즉 존재가 드러나는 지평을 전제로 하는데, 하이데거에게서 이 지평은 바로 인간 현존재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모든 존재자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현존재)만이 존재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의미를 탐구하는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은 일차적으로 이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인간 현존재의 실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시작된다.
하이데거가『존재와 시간』에서 존재물음을 인간현존재 분석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그의 존재탐구 또한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비판철학에서 ‘대상의 가능조건’이라는 존재의 지평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는 존재의 지평을 코페니르쿠스적인 전환을 통해 대상적 차원에 있는 존재자들에서가 아니라 인간주체에서 찾으며, 이러한 자신의 철학을 '초월(론)적(transcendental)' 철학이라고 부른다.
하이데거 역시 칸트에서 후설의 현상학까지 전해 내려온 ‘초월(론)적(transcendental)'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존재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인간 현존재에서 찾는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Existenz)에서 찾아지며, 실존은 가능성이라는 밖을 향해 나아가는 결코 현실화될 수 없는 가능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으로서의 현존재는 세계-내-존재로서 구체적인 자신의 고유한 역사적 세계 속에 존재하는데, 하이데거에 있어서 역사 세계는 인간의 유한한 시간성에 기초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뒷부분에서 현존재의 역사성을 시간성개념과 관련하여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존재자적인것과 역사학적인 것”(Ontisches und Historisches)을 구분하는데, 이 구분에서 우리는 그의 존재물음이 역사적인 세계에서 드러나는 존재를 해명하는 것에 방향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비록 하이데거는 초월론적 철학을 강조하지만, 그의 초월론적 사유는 칸트 또는 후설의 초월론적 사유와는 달리 시간성, 더 자세히 말해 역사성 개념으로 이어진다.
하이데거의 사유는 현존재분석에 초점을 맞춘 전기 사유와 존재를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후기 사유로 나뉜다.
하이데거 후기 사상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논의는 신에 대한 사유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사유이다.
하이데거는 『철학에의 기여』에서 존재론적 초월과 현대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신 개념을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전통 존재론은 존재신론(Ontotheologie)으로 완성되었고, 일신론이나 유신론은 유대교적-그리스도교적 변증론 이래로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유신론은 니체가 니힐니즘에서 주장한 신의 죽음과 더불어 붕괴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그리스도교 신과 결별해야하며 동시에 도래하는 신의 지나가버림에 대해 예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현대적 시대에 도래하는 새로운 신은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에 의거하며, 또한 마지막 신에 대한 고지는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기술과 전향』에서 현대 기술의 본질을 ‘탈은폐’에서 찾으며, 이는 존재의 지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현대 기술의 특징은 석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용도에 맞게 밖으로 끌어내어 우리 앞에 탈은폐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현대 기술문명에서 인간은 모든 사물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지배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힘을 행사하는데, 이 무제한적 힘 또한 현대 기술에서 탈은폐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기술의 발전은 존재에 의해 열어 밝혀진 역사적 지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그리스 ‘테크네’에서 필연적으로 유래된 현대 기술의 본질은 서양 역사에 기초한 존재의 역운(Geschick)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기술은 역사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서양 역사에서 사물들은 각 시대에 따라 ‘존재자(ontos)' 또는 '대상(Gegen-stand)' 이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기술 시대에서 사물들은 ’부품(Bestand)‘이라는 방식으로 탈은폐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들의 탈은폐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양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존재에 의해 가능하며 기술 시대의 도래 또한 이러한 존재역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하이데거는 서양에서 시작된 존재역사가 ’기술 시대‘에 이르러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 전 인류의 역사적인 현실이 된다고 진단한다는 사실이다.
20세기 철학에서 하이데거 철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철학적 사유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신학의 영역에서는 개신교 산학자 루돌프 불트만과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 그리고 정신분석학 영역에서는 라캉, 비스방어, 보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철학의 영역에서는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와 마르쿠제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 탈-구조주의철학자인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임마누엘 레비나스 그리고 해석학 분야에서는 한스 가다머와 폴 리쾨르가 하이데거 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다.
주요 저작
Heidegger DB
| 총 게시물수: 276 | 페이지:1/14 |
|
번호 MH01100276 MH01100275 MH01100274 MH01100273 MH01100272 MH01100271 MH01100270 MH01100269 MH01100268 MH01100267 MH01100266 MH01100265 MH01100264 MH01100263 MH01100262 MH01100261 MH01100260 MH01100259 MH01100258 MH01100257 제목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철학에의 기여 주제 언어는 인간을 가장 근원적으로 탈인간화하는 것이다. 신들은 존재로부터 발원한다. 언어는 인간과 더불어 주어진다. 생생한-고유화로서의 존재가 역사이다. 생생하게-고유화함은 인간을 존재에게로 넘겨줌이다. 존재의 본질은 생생한 고유화이다. 존재를 위해 존재의 역사의 유일성을 구원하는 것이 사유의 소명이다. 역사적이게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존재의 본질로부터 발원하며 또한 따라서 거기에 귀속한 채로 남아 있음이다. 형이상학의 지배로 인해 우리에게 존재는 단지 존재자를 존재자로 표상하는 행위의 부수적 성과로서만 표상되기에 이르렀다. 존재자 안에서 출현하는 것들은 근대적 인간을 존재의 진리의 영역에로 데려올 능력이 전혀 없다. 철학은 존재에 대한 사유이다. 마지막 신은 가장 오랜 역사를 위한 최단 궤도에서 그 가장 오랜 역사의 시원이다. 마지막 신은 가장 유일한 유일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 신은 생생한 고유화를 필요로 한다. 도래할 자들에게만 생생한 고유화로서의 존재(도약)는 도-래한다. 하나의 민족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할당된 그대로 정성껏 간수할 때만 비로소 민족이다. 도래할 자들은 근본기분 안에 존재한다. 도래할 자들은 진리의 본질을 근거짓는 자들이다. 현-존재를 근거지음에 대한 숙고가 없으면, 기술의 힘은 척도를 망실할 정도로까지 증강된다. 간직함은 진리의 현성에 속한다. 저자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