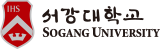미르체아 엘리아데
생애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1907년 루마니아의 수도 부크레슈티에서 태어났다. 1917년에서 1925년까지 스피루-하레트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했으며, 1921년에 『나는 어떻게 철학자의 돌을 찾았는가?』라는 최초의 글을 잡지에 기고하였다. 192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쿠레슈티 대학의 철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28년 로마에 머물면서 『이탈리아 철학, 마르실리오 피치노부터 조르다노 브루노까지』를 쓰면서 인도의 다스굽타 교수와 교류를 하게 된다. 1928년에 인도에 가서 다스굽타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엘리아데의 생애는 큰 전기를 맞는다. 1936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 『요가: 인도 신비주의의 기원』은 파리와 부쿠레슈티에서 동시에 출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33년 1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해 11월에 이오네스코 대학의 논리학 및 형이상학 교수로 임명되어 ‘인도 철학에 있어 악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루마니아 문정관으로 런던과 리스본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1947년에서 1950년 사이에는 파리 대학과 로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종교형태론』과 『영원회귀의 신화』 등을 출간한다. 1956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이후 많은 주저들을 출간한다. 1986년에 『종교관념의 역사』(A History of Religious Ideas) 2권을 출간하고 그 보완작업을 하던 중 엘리아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요 업적과 사상
엘리아데는 종교 현상 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종교적 현상의 심층적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러한 탐구가 내부로부터의 이해, 즉 감정의 차원에서의 믿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Rudolf Otto에 의해 설립되고 Gustav Mensching에 의해 더욱 차별화 된 종교학을 계속 발전시켰다.
엘리아데는 또한 종교학의 체계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체계적인 측면이 종교적 대상의 다양성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종교적 현상들의 초역사적 의미와 보편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엘리아데는 샤머니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개척자로서도 알려졌는데, 그는 샤머니즘을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인간 종교성의 원초적 현상으로 파악했으며, 샤머니즘의 경험을 정신병리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견해에 반대하면서 부족 형태의 영적 형태들과 역사적 종교들을 동일한 가치에서 사유하였다.
철학적으로 엘리아데는 역사와 과학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신화, 종교 및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탈신화적인 근대세계에서도 남아 있는 종교적 태도의 잔재들을 추적하였다. 그는 고대 존재론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그에게서 신성함은 오히려 신화 속에서 드러나는데, 신화에서는 어떻게 우주가 전체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연에서 각 개별 부분들이 생성되는지가 기술된다. 신화와 제식은 엘리아데에 따르면 전통 사회에 대한 우주론적인 정당화이고 우주적 질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엘리아데는 근대 합리주의적 문화와 유럽중심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신화적 사유와 타문화의 문화적 뿌리와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주요 저작
Eliade DB
| 총 게시물수: 250 | 페이지:1/13 |
|
번호 ME01800250 ME01800249 ME01800248 ME01800247 ME01800246 ME01800245 ME01800244 ME01800243 ME01800242 ME01800241 ME01800240 ME01800239 ME01800238 ME01800237 ME01800236 ME01800235 ME01800234 ME01800233 ME01800232 ME01800231 제목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 주제 상징은 개인적 체험을 깨우고, 그체험을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로 변모시킨다. 무의식은 실존적 위기로 인해 종교적인 분위기를 갖게 된다. 종교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도 여전히 유사 종교와 타락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인간 실존은 저급한 마술과 희화화된 종교 형태로 탈신성화 되었다.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에서 유래하며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근대의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적인 것을 모두 거부한다. 종교적 인간은 세계 안에서 절대적 실재의 현존, 성스러움의 현존을 믿는다. 고대사회와 원시 문명의 종교적 경험은 우리 자신의 역사의 일부를 형성한다.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려는 자는 세속적인 존재 양식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원시 사회에서 인간은 통과의례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자 했다. 뱃속으로의 귀환은 상징적으로 태초 어둠 속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 뱃속으로의 귀환은 상징적으로 우주적인 의미를 뜻한다. 여성의 결사는 언제나 출생과 출산력의 신비와 관련되어 있다. 가입식에는 성스러움의 계시, 죽음의 계시, 성(性)의 계시가 포함된다. 원시인은 어떤 종교적 인간의 이상을 획득하려고 시도한다. 가입식 의례는 초인간적인 기원에 유래한다. 원시인은 인간의 이상을 초인간적인 지평에다 설정했다. 속된 세계에서 사망, 결혼, 출생은 급진적으로 세속화되었다. 비종교적 인간은 통과의 제의적 성격을 상실했다. 탄생, 결혼, 죽음의 때에 통과 의례가 있다. 저자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미르치아 엘리아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