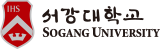이능화
생애
이능화(1869-1943)는 충청북도 괴산 출생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현(自賢), 호는 간정(侃亭), 상현(尙玄), 무능거사(無能居士), 상현거사(尙玄居士) 등을 썼다. 천주교를 신앙하는 집안에서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한문 교육을 받았다. 19세가 되던 해에 관직에 있던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사하면서 근대교육을 받았고, 외국어 학당과 학교에서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을 배웠다.
집안의 종교 배경과 달리 이능화의 연구는 불교와 한국의 종교 전통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는 불교계의 근대화와 진흥사업에 노력하였으며, 1906년 불교교육기관인 명진학교의 제2대 교장으로 잠시 취임하기도 하였다. 1915년, 불교진흥회의 간사로 참여하면서 『불교진흥회월보』 편집을 담당하였고, 거사불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능화는 1918년부터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 충추원의 조선의 옛 관습 및 제도 조사, 1921년부터 조선총독부의 학무국 편수관 활동, 조선사편찬위원회, 조선사편수회 등에 참여하였고, 사무관, 편수관 등을 역임하였다. 1940년에는 조선사 편찬의 공로를 인정받아 총독부로부터 은배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적과 활동 때문에 친일 지식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조선불교와 건국신화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조선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역사와 민속, 종교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한국학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한국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업적과 사상
이능화의 대표적인 불교 연구 저술 가운데 하나인 『백교회통』(百敎會通)은 근대시기 기독교 중심의 비교 연구에 대응하는 성격으로서 불교의 입장에서 모든 종교의 회통을 모색하고 있다. 상·중·하 3권으로 이뤄진 『조선불교통사』는 진화론적인 관점과 한국 불교 종파의 원류, 시대 구분, 법통, 삼종선 등 한국 불교의 주요 주제들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불교 관계의 역사서, 주석서, 문집, 사적기 등 연구 가능한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원시종교를 신교로 규정하고 문화와 관련 연구를 위한 문헌을 학문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한국 종교사적 관점에서 도교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한국기독교급외교사』는 기독교를 한국 종교의 영역에 폭넓게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으며 기독교를 당시 사회의 개화와 연결하여 대비시키고 있다.
민속학과 역사학, 종교 연구 등 대부분 한문으로 저술되었던 그의 저서들이 70년대 이후 번역되고 연구되면서 한국학 전통에서 전근대와 근대를 연결하는 그의 위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주요 저작
Lee DB
| 총 게시물수: 501 | 페이지:1/26 |
|
번호 LN00900501 LN00900500 LN00900499 LN00900498 LN00900497 LN00900496 LN00900495 LN00900494 LN00900493 LN00900492 LN00900491 LN00900490 LN00900489 LN00900488 LN00900487 LN00900486 LN00900485 LN00900484 LN00900483 LN00900482 제목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백교회통 주제 성현은 무위법이라는 점에 차별이 있는 것이다. 영혼과 사념을 말하다. 영혼과 사념을 말하다. 영혼과 사념을 말하다. 현상과 본질을 말하다. 의식이 나오는 근본을 말하다. 의식은 현상이다. 의식은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는 것과 의식을 말하다. 영혼을 보려고해도 볼 수 없다. 칸트의 영혼에 대한 견해를 말하다. 스펜서의 견해를 말하다.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고 말하다. 마음의 양과 신력에 대해 말하다. 마음의 대소 변화에 대해 말하다. 마음의 본래의 양을 말하다. 마음은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 놀라고 공포에 휩싸이면 마음은 위축된다. 심신이 태연하면 마음은 광대해진다. 신통의 일은 마음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저자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이능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