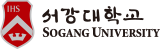요한 고트립 피히테
생애
요한 고트리프 피히테는 1762년 5월 19일 작선 선제후국의 오버라우짓츠(Oberlausitz) 지역 라메나우(Rammenau)에서 가난한 리본제작공(Bandmacher)의 10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18세에 예나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했고 이후 라이프찌히 대학과 뷔텐베르그 대학에서 공부했다.
1784년 경 학업을 중단하고 여러 곳에서 가정교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1792년 익명으로 출간한 종교철학 저작 《모든 계시에 대한 비판의 시도》(Versuch einer Kritik aller Offenbarung)로 단번에 철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1793년 말 라인홀트(Karl Leonhard Reinhold)의 후임으로 예나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었다.
1974년부터 1799년 예나 대학을 떠날 때까지의 기간이 피히테 경력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1798년 자신이 편집하고 있던 철학잡지(Philosophisches Journal)에 발표한 포어베르그(Wilhelm Karl Forberg)의 논문 “종교개념의 발전”(Entwicklung des Begriffes der Religion)에 함께 실은 자신의 서론 격의 글 “신의 세계통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 대하여”(Über den Grund unseres Glaubens an eine göttliche Weltregierung) 때문에 소위 무신론논쟁에 휘말리고 결국 1799년 예나 대학에서 파면되었다.
그 후 피히테는 예나를 떠나 베를린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1800년 3월 예나를 최종적으로 떠났다.
그는 베를린에서 1800년과 1801년 많은 저술을 출간했으며, 베를린과 에어랑엔에서 대중강연도 하였다.
1806년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을 굴복시키고 베를린으로 진격할 때 피히테는 쾨니히스베르그(Königsberg)로 도망가 거기서 정교수로 임명 받아 강의했다.
그러나 프랑스 군대가 쾨니히스베르그를 막 점령하자 피히테는 이 도시를 떠나 코펜하겐으로 갔는데, 1807년 굴욕적 강화조약인 틸짓(Tilsit)조약이 체결되자 그는 아직 프랑스에 점령 중이지만 그의 가족이 이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살고 있던 베를린으로 돌아간다.
거기서 피히테는 1807년부터 1808년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4차례에 걸쳐 《독일국민에게 고함》(Reden an die deutsche Nation)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1810년 피히테는 새로 창설된 베를린 대학에 정교수로 초빙되어 강의를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1811년 총장으로 선출됐다.
1813년 초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부상자를 돌보던 자신의 부인이 1814년 티푸스에 걸리게 된다. 피
히테는 자신의 아내를 돌보다 1814년 1월 27일 52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녀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업적과 사상
피히테는 칸트주의자를 자처했지만, 물자체와 현상을 분리하고 오성과 이성을 구분하는 데에서는 칸트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인식의 가능조건과 인식능력 자체를 구분하는 칸트의 입장을 비판했고 이를 철저히 초월철학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이성” 안에서 단일화하려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철학은 《지식학》(Wissenschaftslehre)이다. 철학은 다른 학문처럼 대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다.
피히테는 《지식학》을 통해 한 가지 원리로부터 수미일관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지식을 도출하고자 했다.
피히테는 칸트철학이 지식학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본다.
칸트는 인식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주장했지만, 동시에 그 인식은 외부의 대상에 의존함을 인정함으로써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또한 칸트에게서는 선험적 주체의 개념 역시 근본적이지 못하며 불철저하다.
왜냐하면 선험적 주체에 대해 무언가 말할 수 있다는 건, 선험적 주체에 대하여 인식하고 판단하며 말하는 또 다른 주체가 먼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피히테는 자아와 비아, 주체와 대상을 연관지우고 통일시키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드러내는 원리로서 “자아”를 정립했다.
피히테가 생각한 “절대적 자아”란, 행위를 통해 자아와 비아를 동시에 정립하는 “자아”이다. 이런 의미에서 피히테에게 자아와 비아의 종합만이 절대적이다.
이 자아는 자기 안에서 자아를 정립하고 또한 비아를 정립한다. 피히테에게 자아는 인식의 대상으로 경험될 수 없다.
인식의 대상이란 비아, 그것도 자아가 자체 내에서 산출한 비아일 뿐이다. 자아 외부에 있는 어떤 것도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철학적 관점에서 피히테는 자아의 무제한적 자유를 강조한다.
피히테는 자아를 “무한을 향한 행동자”라고 말하는데, 도덕적 질서는 완전성을 추구하는 자아의 노력에 있으며, 이 도덕적인 질서야말로 신적인 질서라고 한다. 칸트가 신적인 질서를 도덕적 질서로 환원했다면, 피히테는 도덕적 질서를 다시 자아의 노력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주요 저작
Fichte DB
| 총 게시물수: 749 | 페이지:1/38 |
|
번호 JF01000749 JF01000748 JF01000747 JF01000746 JF01000745 JF01000744 JF01000743 JF01000742 JF01000741 JF01000740 JF01000739 JF01000738 JF01000737 JF01000736 JF01000735 JF01000734 JF01000733 JF01000732 JF01000731 JF01000730 제목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인간의 사명(1800) 주제 자연에서의 모든 죽음은 곧 탄생이며, 바로 죽음 안에서 생의 고양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오직 선하기 때문에 선을 미워하고, 단순한 악에의 사랑 그 자체에 의해 악을 촉진하는 그런 도치성만이 내게 정당한 분노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어느 누구도 그런 도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나는 내가 최고의 현명함과 선함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며, 이 세계는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며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할 것임을 안다. 그리고 이 확신 안에서 나는 평안하며 행복하다. 나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은 이성적 존재의 왕국에서의 이성과 윤리성의 진보이다. 이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도 기쁨이나 슬픔에 의해 나를 움직일 수는 없다. 나는 냉정하고 흔들림이 없이 모든 것을 조망할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떤 것 하나도 해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를 통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이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며, 내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타자의 자유의 사용에 있어 내게 악으로 보이는 것을 막거나 지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몸과 영혼에 있어서 그리고 나에게 관계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 자신을 오직 의무의 수단으로서만 간주해야 한다. 나의 전체 사명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그것이 내게 확실하고 또 그것이 정신의 아버지 자신처럼 영원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뿐이다. 우리 모두에게 타고난 감성적 행위 방식 외에 또다시 사유에 의해서 자신의 감성을 강하게 하며 감성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자, 그리하여 감성과 더불어 성장하는 자는 오직 계속되고 끝까지 행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자신을 지속적이고 완전하게 감성 너머로 고양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사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며 모든 감성적인 것을 넘어선다. 자연에서의 모든 죽음은 곧 탄생이며, 바로 죽음 안에서 생의 고양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오직 선하기 때문에 선을 미워하고, 단순한 악에의 사랑 그 자체에 의해 악을 촉진하는 그런 도치성만이 내게 정당한 분노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어느 누구도 그런 도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나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은 이성적 존재의 왕국에서의 이성과 윤리성의 진보이다. 우리 모두에게 타고난 감성적 행위 방식 외에 또다시 사유에 의해서 자신의 감성을 강하게 하며 감성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자, 그리하여 감성과 더불어 성장하는 자는 오직 계속되고 끝까지 행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자신을 지속적이고 완전하게 감성 너머로 고양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사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며 모든 감성적인 것을 넘어선다. 개인에 있어서는 그의 의무에 따르는 의지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것도 있을 수 없으며, 공동체에 있어서는 공동체적으로 의무에 따르는 의지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것도 있을 수가 없다. 너[영원한 의지]는 나의 자유로운 복종이 모든 영원성에 있어 결과를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할 뿐이다. 유한자인 나에로의 너[영원한 의지]의 연관 및 관계는 내 앞에 선명히 드러나 있다. 즉 나는 내가 되어야 하는 바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한 의지의 삶이다. 저자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요한 고트립 피히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