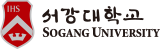백용성
생애
법명(法名)은 진종(辰鍾), 속명 상규(相奎), 용성은 법호(法號)이다.
조선 후기에 태어나 일제 말기인 1940년에 입적하기 까지 치열한 수행, 후학지도, 불교중흥, 식민지 불교의 극복, 불교 개혁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근대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1911년 서울 종로구 복익동 1번지에 대각사(大覺寺)를 창건하였고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
이 일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불교종단의 정화를 위하여 힘쓰고 대처승의 법통계승(法統繼承)을 인정하는 일본의 종교정책에 맹렬히 반대하였다.
한편 불교의 대중화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저술에 진력하였으며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각교(大覺敎)를 창설하였다.
그의 대표적 활동은 한국불교 보종운동인 임제종 운동, 수좌 지도 활동, 도회지 포교, 3.1운동 참여, 선학원 창건, 만일참선결사회 주도, 새로운 불교 대각교 운동 등이다.
당시 불교계의 모순을 직시하고 불법 천양 및 불법 포교, 불교의 활로를 연 수행과 역사참여라는 대승불교의 전범을 보여준다.
1922년 중국 연길에 대각교당(大覺敎堂)을 설립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40년 2월 24일 나이 77세, 법랍 61세에 입적하였다.
주요 업적과 사상
7세 때인 1870년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한 후, 16세 때 해인사(海印寺)에 들어가 화월화상(華月和尙)을 은사로, 혜조율사(慧造律師)를 계사로 불법 수도의 길에 들어섰다. 48세에 상경하여 도시포교와 참선을 대중에게 지도하면서 불교대중화에 앞장서게 된다. 1912년부터는 일본불교에 저항하기 위한 자주적인 불교운동을 펼친 임제종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임제종 중앙포교당 (現 인사동)에서 조실로 주석하면서 선종포교당에서 선리 및 교리 강의를 3년간 계속하였다. 이때 한용운은 총무격인 운영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12년부터 경성 선종 중앙포교원의 포교사로서 선리를 밝혀 한국선의 전통의 계승을 위한 노력과 범어사 백양사 운문암 등에서 수행에 정진한다. 백용성은 1919년 3.1운동을 주동하여 3·1독립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하였고, 치안유지법 위반 지도자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수감 중에 개신교, 천도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말로 된 간편한 성경 및 교리서를 보게 되었다. 이에 불교의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보급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독립운동과 불교대중화를 위한 결심의 계기가 된다. 1921년 조직적인 역경사업을 수행할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조직하여 조직적인 경전 번역의 길로 나아간다. 또한 그가 펼친 대표적인 대각교운동은 “내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자(自覺覺他)”는 것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지향한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억불숭유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삶의 문제와 괴리된 채 산중(山中) 불교화되고, 또 개항 이후 일본 불교의 침투로 말미암아 왜색화되고 있던 기존 불교를 개혁하여 대중불교와 호국불교로서의 한국 불교의 전통을 되살리자는 것이었다. 1924년부터 박한영 등과 함께 <불일(佛日)>이라는 불교 잡지를 발행하고, 여러 도시에 포교당과 선원을 개설하고 수시로 선회를 열어 불교 대중화 운동을 통한 민족 계몽운동에 박차를 가해 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요 불교학교를 개설하고, 모든 불교 의식과 염불, 찬불가(讚佛歌) 등을 우리말로 포교함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 방식의 현대화에도 힘썼다. 또한 불교종단의 정화를 위해 대처승(帶妻僧)을 인정하는 일본정부내무대신(日本政府內務大臣) 앞으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주요 저작
Baek DB
| 총 게시물수: 500 | 페이지:1/25 |
|
번호 BY01500500 BY01500499 BY01500498 BY01500497 BY01500496 BY01500495 BY01500494 BY01500493 BY01500492 BY01500491 BY01500490 BY01500489 BY01500488 BY01500487 BY01500486 BY01500485 BY01500484 BY01500483 BY01500482 BY01500481 제목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각해일륜 주제 둘이 아닌 성품은 곧 실성이라 불린다. 법신(法身), 화신(化身), 보신(報身)은 하나이다. 법신(法身), 화신(化身), 보신(報身)은 하나이다. 항상 각의 지견의 눈을 떠야 한다.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된다. 각의 지견은 당신의 마음이지, 어떤 다른 깨달음이 아니다. 마음 전체가 각(覺)이다. 정(定)에 즉한 것은 혜(慧)이다. 법신(法身), 화신(化身), 보신(報身)은 하나이다. 청정법신은 의식[識]과 지혜의 영역을 넘어선다. 청정법신은 우리의 본연성과 같다. 우리는 사홍서원을 통해 각성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을 제도한다는 것은 정견과 지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을 제도해야 한다. 참회(懺悔)는 과거의 죄업에 대한 회개와 미래의 행동에 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무상참회(無相懺悔)는 자신의 업을 정화시킬 것이다.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오분법신향(五分法身香) 중의 하나이다. 해탈향(解脫香)은 오분법신향(五分法身香) 중의 하나이다. 혜향(慧香)은 오분법신향(五分法身香) 중의 하나이다. 정향(定香)은 오분법신향(五分法身香) 중의 하나이다. 저자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백용성 |